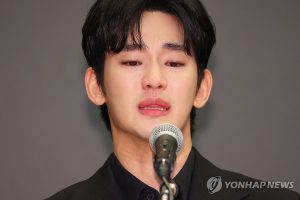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략전 카드..
국가의 정책을 비지니스 딜로 인식..
미국기업과국민에게 경제적 피해 전가..
미국이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인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전략적 카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을 보호한다? 실상은 정치적 계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철강,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 유럽산 철강, 캐나다산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이 조치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중간선거 그리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관세를 통해 자신을 ‘미국 노동자를 지키는 강한 지도자’로 포장하며,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다.
특히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에게 “나는 중국과 싸우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밀집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을 “미국을 팔아먹은 글로벌리스트”로 몰아가며 ‘우리 vs. 그들’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을 위한 보호막’이라고 포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미국 경제를 망친 원흉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프레임은 공화당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대중을 선동하는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활용해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높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한 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그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개정했고,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대신,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해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 기업들은 수입 비용 증가로 경쟁력을 잃었고, 농민들은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길이 막혔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트럼프의 ‘널뛰기 관세 정책’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FBI, 리처드 김씨 기소
FBI, 리처드 김씨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