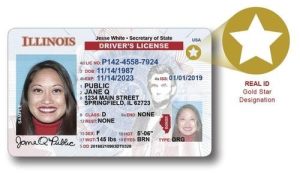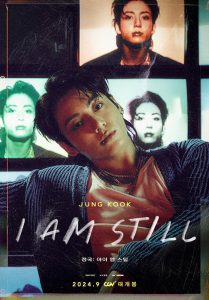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게서 뇌 손상이 만연하게 나타난 사실을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발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해군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네이비실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소는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네이비실 출신 데이비드 메칼프 대위의 뇌 조직에서 일반적인 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 패턴을 발견했다.
해당 패턴은 강한 폭발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으며, 폭발음 노출의 대부분은 메칼프 대위 본인의 개인 화기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네이비실 복무 도중 혹은 복무를 마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메칼프 대위 외에도 최소 10여 명이 있었다.
이 중 8명의 유가족이 국방부 연구소에 뇌 조직 조사를 의뢰했고, 이 연구소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폭발음 노출에 의한 뇌 손상을 파악했다.
그러나 연구소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군 관료조직 간 소통 부재로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네이비실 지휘부는 국방부 연구소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나아가 폭발음 노출에 따른 뇌 손상은 아직 생존 중인 네이비실 대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만연한 이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부대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촬영 검사에서 폭발음 노출과 뇌 구조 변화의 상관관계가 발견됐으며, 폭발음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건강 및 삶의 질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폭발음 노출에 따른 뇌 손상은 다양한 종류의 화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징후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포병 부대원은 전투에서 수천 발의 포탄을 발사한 뒤 환각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집에 돌아왔고, 박격포 대원들도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믿음직한 병사들조차 전투나 훈련 과정에서 전차의 포격이나 수류탄 폭발음에 시달린 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이웃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하버드대 의대의 뇌 손상 재활 분야를 책임지는 대니얼 데인시바 박사는 폭발음이 증세 없이 뇌세포를 죽일 수 있다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