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총선 고의패배 이끈것 아닌지” vs 한동훈 “다중인격 구태정치 청산해야”
나경원 “추태·줄세우기·구태 절정”, 윤상현 “총선 패인 규명안한 게 논란 본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0일(이하 한국시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총선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서로를 향해 “말이 안 되는 변명”, “다중 인격”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 취지 문자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후보가 무시한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원 후보는 사적 소통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같은 테이블에서 대면해 이야기하면 이것도 당무 개입이고 사적 채널이냐”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는 ‘공천 문제도 총선 백서에 담겨야 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공천 문제를 안 담으면, 백서에 무엇을 담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원 후보를 향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계속 도망만 다닌다”며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것이 자랑스러운 정치냐”고 비꼬았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밀한 문자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한 구태 정치”라며 “공작에 가까운 매터도(흑색선전)”라고 재차 비판했다.
총선 백서를 두고서는 “발간자 상당수가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백서가 개인 정치의 수단이 됐다. 전대를 혼탁하게 만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원 후보 보좌진이 한 후보의 가족 비방 영상을 유포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많이 넘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이처럼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문자 무시 논란과 사천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자 각각 ‘줄 세우기’와 ‘패인 미규명’을 분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며 “줄 세우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는 처음 봤다. 구태 정치와 손잡은 분들을 빨리 손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당이 90일이 넘도록 공개적으로 총선 패인을 규명하지 않은 것이 논란의 본질”이라며 조속한 총선 백서 발간을 요구했다.
주자들은 앞선 연설회 정견 발표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는 원 후보를 겨냥, “‘선관위 때문에 매터도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하루 만에 신나게 매터도를 한다”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의 화합에 방점을 찍었던 사전 배포 연설문보다 실제 발언의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후 특검 검토’ 입장과는 달리, 여당의 독자적인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나 후보는 “(야당을) 이미지 정치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특검 덫에 걸려드는 초보 정치로 이길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 하는 대표. 전력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한·원 후보를 비판했다.
대리인 격인 최고위원 후보들도 설전을 벌였다.
한 후보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인 박정훈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문자까지 누군가 공개했다. 정말 못난 짓”이라고 성토했다.
친윤석열계 이상규 후보는 “총선에서 초보자에게 큰 함선을 맡겼다가 엄청난 폭풍 속에서 난파했다”고 말해 한 후보 지지자들의 비판을 샀다.
당권 주자들은 이날 PK 발전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총선 당시 ‘개헌저지선’을 사수한 PK에 대한 감사 인사도 앞다퉈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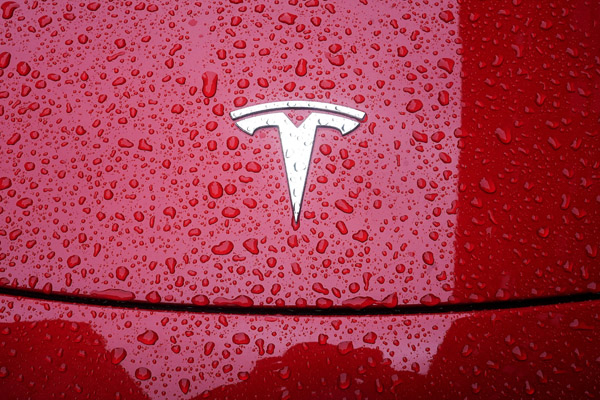




 3년새 숫자 2배 이상 증가
3년새 숫자 2배 이상 증가






































